북한의 경제상황, 그들은 왜 남한의 군사력 축소와 주한미군철수를 강요했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사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1건
조회 481회
작성일 06-10-14 23:24
천사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1건
조회 481회
작성일 06-10-14 23:24
본문
이 글은 북한의 경제실정을 설명하는 글이지만, 그와 관련, 북한이 여지껏,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군감축과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해온 이유와 1980년대에 한반도의 비핵화 계획을 밀어 부친 동기, 즉, 북한노동당규약(1980년 10월 6차 당대회 개정)에 발맞춰, “민족해방” 이란 명목으로, '혁명위업'- 바로 한국의 공산화하여, 한국을 북한에 편입해 통일하려는 그들의 의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방대학원의 이석호씨의 글을 블로그에서 퍼온것입니다.
http://kr.blog.yahoo.com/sockokyu/1462764
北韓의 軍備統制 政策
I. 序 論
오늘날 韓國과 北韓의 상호관계는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경쟁적, 적대적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韓國과 北韓은 서로 준수하기로 약속한 휴전협정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방 방어지역은 물론 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 진지를 구축하여 요새화하고 있다. 군사정전협정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는 문자 그대로 비무장지대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비무장지대가 무장화, 요새화 되어 유사시에 양측의 최전방 방어지역, 또는 공격출발진지로 되어가고 있다. 양측은 韓國戰爭이 끝난 후부터 오늘까지 점진적으로 國防費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로 시간이 흐를수록 쌍방의 군사력은 증강되었으며 양측 사회의 전쟁준비태세 또한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방면은 양측은 군비경쟁을 하면서도 군비경쟁이 가져온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전쟁위험성의 증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韓國과 北韓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의 감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이 論文에서는 북한에 관해서만 토의하려고 한다.
韓國과 北韓간에 형성된 긴장과 적대적인 군사관계에 대해 북한의 정책은 무엇인가? 北韓은 이러한 군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이나? 보다 기본적인 질문으로서, 北韓은 오늘날 韓國과 北韓간의 군사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北韓은 정말로 韓國과 軍事問題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북한이 말하는 정치•군사회담은 韓半島 군비통제를 위한 것인가? 북한은 軍備統制를 대 한국 군사정책 및 韓半島統一政策(소위 한반도 적화전략)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나? 이러한 질문들을 기초로 하여 北韓이 갖고 있는 軍備統制 개념과 韓半島 軍備統制에 대한 북한의 정책을 밝히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II. 軍事會談 提案 內容
韓國과 北韓은 군사력 증강을 위주로 전쟁준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재통일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상호 제안하여 왔다. 한반도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휴전이후부터 1989년 말까지 북한은 64회, 한국은 29회 軍備統制方案을 상대방에게 제안했다.
도표1: 한국•북한의 군비통제제안 횟수
韓國은 北韓에 비하여 제안 빈도수는 적지만 시기적으로도 1970년 8월 15일에 처음으로 광복절 25주년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제안했다. 그 이후 모든 제안의 내용도 매우 단순하고 제한적이며, 점진적이다. 1970년부터 1989년 말까지 29회를 제안했으나 모든 제안을 '무력 포기에 관한 선언 또는 협정체결' '상호신뢰구축방안'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軍備統制 실천문제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상호신뢰구축 분위기 조성을 제일 중요한 첫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1988년 6월 10일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군축3단계 접근방안'이나, 같은 해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본회의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平和市 건설'제의는 한반도 軍備統制問題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北韓은 韓國보다 2배 이상을 제안했으며 매 회마다 2가지 이상의 안건을 제시하였고 한반도 군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안건을 거론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이 제안한 안건들은 9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북한이 가장 빈번하게 제안한 안건은 ① 주한미군 철수, ② 상호병력과 장비 감축, ③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장 빈번하게 주장했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주한미군이란 北韓이 韓國을 가장 뚜렷하게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며, 자신의 대 한국 군사우위를 실질적으로 상쇄하는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환경조성의 방해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체결 또한 매우 빈번히 제안되었는데, 북한은 오늘 그 체결대상을 韓國이 아니라, 美國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1974년 3월 이전까지는 평화협정을 한국과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美國과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북한의 대 한국전략의 첫째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임을 말하며, 나아가 한•미간을 이간시키려 하는 것이다.
韓國은 병력과 장비의 감축을 軍備統制의 안건으로 제안한 적도 없으며 더욱이 軍備統制 첫 단계로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병력과 장비의 감축을 빈번하게 제안하고 있으며 그것도 신속하게 축소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상이한 입장은 양측이 군사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의도의 차이에서 온다고 보여진다. 지난 40년간의 북한군사력의 증강추세와 오늘날 군사적 준비태세를 볼 때 북한의 군비축소 주장은 많은 의문점을 남겨 놓는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서는 자신의 군사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또는 한국사회를 분열, 혼란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볼 때 비현실적인 제안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3가지 안건 이외에 최근 北韓의 강경한 주장은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이다. 北韓은 1980년대에 와서 국제적으로 반핵 운동의 확산, 고르바쵸프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핵 지대화 주장에 편승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주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 운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술핵 무기의 철수를 의미하나,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제안하여 온 내용들을 근거로 할 때 북한의 의도는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 군사력의 감축이다. 1987년 7월과 1988년 11월에 한국에게 제시한 軍備統制案은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단계별 감군을 제안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제안하여 온 모든 내용과 오늘날 북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단계적'이라는 측면도 한국과 기본적으로 다르며, 지금까지 한국이 주장해 온 '신뢰구축 방안'과 '무력사용 포기' 문제와 타협하려는 의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은 주한미군과 전술핵무기 철수, 한국과 북한병력 및 장비의 감축, 이를 위하여 3자 회담을 개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한국과 불가침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한국이 우선시하는 '상호신뢰구축'과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으로 '軍備減縮'부터 실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표현하면, 한국은 군비의 감축을 제의한 적이 없고, 북한은 상호신뢰 구축을 가장 적게 언급하였다. 韓國과 北韓이 제안한 내용만을 근거로 할 때 북한이 한국보다 더 긴장완화에 열성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의 진실여부는 다른 측면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Ⅲ. 軍事準備態勢
북한은 全韓半島의 공산화를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 한국을 상대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군사력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혁명분위기가 조성되어 결정적인 시기라고 판단되면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 분위기를 혁명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의도 하에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대 한국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군사 이론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蘇聯군사이론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군사이론을 발전시켰다. 새로이 발전시키고 있는 군사이론에는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경험, 한국전쟁 경험, 한국적인 지형과 기후, 모택동의 인민전쟁론, 타국의 전쟁 경험(베트남과 중동전쟁), 美國과의 전쟁 예상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1962년 12월 소위 '국방에서 자위'노선을 선언하는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였다.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정책으로써 북한은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다. 1966년에는 국방•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여 북한은 군수산업능력을 일찍이 발전시키기 시작하여 오늘날 군사력증강의 기틀을 세웠다.
북한은 새로운 군사이론의 모색과 독자적인 軍事政策을 발전시켜 60년대 말까지를 군사전략의 기본개념으로서 '총력, 기습, 배합, 속전속결'을 확립하고, 이 개념을 전쟁터에서 작전화 시키기 위하여 작전전략, 무기체계, 군사교리 및 훈련을 발전시키고 있다. 1950년대에는 북한의 병력과 장비가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열세하였으나 60년대 말부터 추월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훨씬 우세한 입장에 있다.
軍事裝備를 양적으로 확대하면서 질적으로도 개선하고 있다. 지상군의 경우, 장비의 경량화, 자동화, 장갑화 시키면서, 부대구조도 소규모화, 기갑•기계화•포병 및 특수부대를 증가시켜, 기동과 화력을 강조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공격과 침투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찍이 잠수함을 보유하기 시작했으며, 거의 모든 함정이 소형이며, 공격전용의 쾌속정과 고속 상륙정을 발전시키면서 대량 보유하고 있다. 空軍의 경우에도 기습과 침투를 위하여 AN-2와 헬기를 다량보유하고 있으며, 작전반경 확대를 위하여 1985년 이후 MIG-23/29를 도입했다.
1980년대에 북한은 기습전과 단기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부대훈련은 공격위주로 실시하면서, 특히 급속도화를 강조하고, 전 한국 지역을 단기간에 점령하는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보병위주의 부대구조에서 기갑, 기계화, 포병부대를 증가시켰고 지상군, 해군•공군을 전반적으로 약50% 평양-원산이남지역으로 추진, 재배치시켰으며 휴전선부근에 대량의 병력과 장비를 은폐•엄폐시킬 수 있는 지하갱도를 구축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거의 10년 늦게 독자적인 전쟁준비태세를 준비하기 시작하여 아직도 북한에 비하여 군사력을 위시한 전쟁준비태세에 있어서 열세한 입장이다. '한국은 오늘날 대 북한 군사전략의 기본개념을 억제와 방어로 확립하는 모든 군사훈련상황과 무기체계의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전략차원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위하여 공세적 성격의 병력과 장비의 운용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군수산업능력은 북한에 비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세한 상황이며, 자체의 군사력 증강수요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GNP 규모의 확대로 국방비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북한보다 더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보다 우수한 장비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군사력증강 속도를 유지하면 2000년대 초에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寒微聯合防禦體制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 및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현시점에서 남북한간의 군사준비태세는 불균형적이고 불안정하며,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태이다. 오직 주한미군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軍備統制에서 자신의 우월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駐韓美軍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략적인 군사적 안정을 파괴하려 획책하고 있다.
Ⅳ. 政治體制의 目標
어느 정치 체제이든 간에 체제의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와 수단 및 방법의 선택은 정치지도자들의 세계관, 가치관, 경험 및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체제가 1인 또는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정치문화가 전체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일수록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발전 또는 정치체제의 목표와 수단의 선택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경우에 정치체제의 목표와 발전수단의 선택이 주민들에게 거의 없고, 김일성에게 있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는 체제의 목표와 목표달성수단이 한반도 군비통제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오늘날 북한의 국내외정책과 활동을 보면 북한공산체제, 또는 김일성 체제의 目標는 다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에서 '혁명위업'의 완수이다. 즉 한국을 공산화한다는 것으로, 북한공산주의체제가 태어날 때부터 추구하고 있다. 둘째로는 경제발전, 셋째로는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완수이다. 첫째 목표는 북한체제의 지상최고의 목표이며 나머지 두 개 목표를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목표인 경제발전은 어느 국가나 갖고 있으며 인류의 영구적인 과제이다. 북한의 경우에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해 주민들의 복지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심지어 경제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셋째 목표는 현재 진행중인 김부자 세습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자는 것이며, 오늘날 북한이 당면한 제일 중요한 과제이며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세습체제방식으로 권력을 이양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체제의 목표로서 ㉮ 남조선해방과 ㉯ 부자세습체제를 다루고 경제발전 문제를 제5장에서 따로 논의하겠다.
가. 南朝鮮 解放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위업'은 바로 한국의 공산화, 즉 '남조선해방'을 의미한다. 북한노동당규약(1980년 10월 6차 당대회 개정)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의 當面目的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북한체제의 목표를 정의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일성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연말경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 일년 중 거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의 연설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어느 나라이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의 보전, 평화유지 등의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한다. 북한지도자들이 주민들에게 강조하는 '혁명위업'은 안보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한국의 존재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논리다. 문자 그대로 북한에서는 '南朝鮮 解放'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하게, 또 아무리 빈번하게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勞動新聞은 매일 어떤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든 최소한 하나 정도는 남조선혁명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해방'의 필연성과 주민들의 사명감을 강조한다. 남조선해방의 필연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를 두고, 주민들의 사명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이용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한반도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려면 한국이 미 제국의자들과 그 앞잡이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만 갖고서는 평화시에 주민들의 경각심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한국과 미국에 의한 북침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지원을 받는 남쪽의 '파쇼도당들'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절박'하다고 주민들에게 말한다. 북한의 한국위협 주장은 해마다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을 83년을 전후로 비교할 때, 한국에 대한 비난의 강조가 커지고, 규탄대회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준 전시상태 선포, 최고사령관 명령하달, 한국과 대화의 중단 등이 있었다. 한국의 북침 위협을 대전제로 하고 동시에 '南朝鮮 解放'을 약속하면서 전쟁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나. 父子세습체제
북한의 대내외 활동을 보면 김정일의 권력계승작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체제의 목표임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후계자작업을 1970년대 초부터 시작했으며,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사실상의 후계자로 공포했다. 1986년 6월 1일 김일성은 '김일성 고급 당학교' 창립 40돌을 맞이하여 '朝鮮勞動黨 건설의 歷史的 경험'을 발표하면서 '혁명위업 승계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그는 권력을 인계받지 못하고 있으며 김일성은 그의 아들 김정일의 지도력을 키워주고 부각시키기 위하여 아직도 고심하고 있다. 북한은 부자세습체제의 정통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습체제를 지지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구축하면서 이론적으로 몇 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北韓勞動黨의 수령론에 근거를 두고, 김일성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지시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둘째로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놓은 '혁명위업'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셋째로 후계자는 김일성의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서 나와야 한다.
넷째로 김일성이 세워놓은 주체혈통을 이어받을 자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후계자의 기본적인 자질은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후계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이유는 김일성이 자신이 정해놓은 혁명과업의 불멸성을 영구히 보장하려는 데 있다.
김정일의 權力承繼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나 권력구조의 구축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세습논리와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하는 많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왜 김정일?'은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북한은 김정일의 영도력을 선전하면서, 동시에 김일성과 동급수준으로 김정일의 우상화작업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바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혁명사적지'를 10개 조성하였고 최근에는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김정일 문헌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8년 2월에는 金正日花를 지정, 동년 11월에는 正日峰을 개막하였다. 북한은 젊은 세대들의 사상무장을 강조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代를 이은 忠誠'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일의 47회 생일을 전후로 해서 북한의 매스미디아들은 김정일에 대한 헌신적 충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당은 곧 수령이며 수령은 곧 당이다."라고 대전제를 하고 당 중앙으로 지칭되어 온 김정일을 '수령'으로까지 묘사하였다.
북한은 체제의 목표로써 '南朝鮮 解放'과 '부자세습체제'를 택하고 그 수단으로서 '위협의식조성' '우상화와 충성심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최소한 한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국내정치여건이 아니다. 南朝鮮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북침 위협의 위기감고조는 군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부자세습체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어도 김정일의 한계는 정치적으로 독재체제 또는 소수지배체제를, 대외적으로는 폐쇄적 체제 또는 엄격히 통제되는 개방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軍備統制를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세습체제---부자세습이든 아니든---의 기본 목적의 南朝鮮革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과 북한간의 軍備統制또는 감축은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經濟構造와 國防費
어느 정치체제나 經濟的 번영을 추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북한은 한국보다 일찍이 계획경제에 눈을 떠서, 1947년부터 시작한 이래, 오늘날에는 3차 7개념계획(1987-1993)을 실시 중이다. 그 동안 북한은 성공의 환희를 맛본 적도 있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좌절의 상태가 시작되었다. 오늘날, 북한이 얼마만큼이나 經濟問題를 강조하느냐는 경제에 관한 노동신문의 사설의 빈도 수에 잘 나타나 있다.
도표 3 : 1988년도 노동신문사설의 분야별 분석
또 하나 북한이 經濟問題를 고민하는 지표로서 북한은 1984년 이후 정무원의 경제 부서를 14차례 개편했으며 총리는 3번(이종옥→강성산→이근모→연형묵) 교체했으며, 특히 86년 이후 國家計劃委員長을 5차례 교체했는데 그중 홍성남을 세 번이나 기용했다. 북한은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정했으며, 정무원 경제 부서에 전자•자동화 공업위원회와 합영 공업부를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는 북한이 외채상황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보았고, 북한을 방문한 외국기자들, 중국과 일본에 이는 한국교포들을 통하여 북한의 주민생활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특히 식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상황과 관련하여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어떻게 軍事費를 계속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었나? 북한이 경제적 낙관에 부딪쳐 있으며 새로운 정책변화가 없으면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1980년부터 있었는데 북한은 왜 그 동안에 시정 못했을까? 북한은 오늘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북한은 89년도 군사비를 정부예산의 12.1%로 책정하고, 88년에는 12.2%를 사용했다고 지난번 최고인민회의 8기 5차 회의(89. 4. 7∼8)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은 정부예산에 약 30%를 國防費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北韓이 실제로 국방비를 얼마 지출하는가를 정확히 모르지만 북한이 실질 국방비를 은폐하고 있으며, 발표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北韓의 國防費는 1971년에 31.1%이었는데, 그 이후 매년 감소하여 1989년에는 12.1%를 책정했다고 한다. 북한의 국방비는 1972년부터 계속 감소하였는데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이다.
둘째로 북한은 1987년 12월에 병력 10만 명을 일방적으로 감군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88년 국방비의 1% 감소는 이러한 감축을 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
셋째로 북한은 1972년부터 국방비를 인민 경제비와 사회문화비에 은폐시키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국방비가 1966년에 10.0%, 1968-1971년에 30%이었다가, 1972년에는 17.0%, 1989년은 12.1%이다. 이렇게 국방비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 인민 경제비와 사회문화비의 변화를 보면 1972년부터 국방비의 일부가 은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로 북한의 주장대로 1972년부터 1989년까지 국방비의 감소 폭이 14.1%에서 18.9%까지 증가하였고 인민 경제비의 증가폭은 11.3%에서 23%까지 증가하였다면 실질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민 경제비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국방비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정도는 1967-71년 사이에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예산의 3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北韓은 1967년부터 軍事費를 급격히 증가시킨 결과 人民經濟費支出에 크게 차질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둔화, 나아가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어려움을 초래했으므로, 주민들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하여 1972년부터 실제 軍事費支出規模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배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침체원인이 바로 국방비를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경제의 침체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유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성격이 공유재산제, 경제가 계획적, 통제적, 폐쇄적이므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체제에게 동기와 경쟁심을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3가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때문이다. 自力更生政策은 대외적으로 국제적 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대내적으로 기술의 낙후를 초래하였고, 重工業優先政策은 자원의 낭비와 산업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軍事•經濟竝進政策은 군수산업에 과도하게 투자하도록 강요했다. 셋째로는 국민경제능력과 정부재정에 비하여 國防費가 장기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앞장에서 토의되었던 체제 목표와 수단이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북한경제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침체되어도 정치지도자가 혁명위업과 세습체제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재정의 많은 양을 여기에 할당한다면 국민경제는 자동적으로 위축될 뿐이지 적절히 대응할 구조적 기능이 없다. 또 북한경제구조는 정부가 결정하는 所得分配構造 자체가 하나의 당위이지 누가 이 問題를 시비 걸 수도 없으며,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자원의 재할당에 있어서도 성장주도적 부문에 대한 자원할당이 강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에 대한 아무런 인지방법(Monitoring System)이나 이에 대응하는 보완방법(Proactive Measures)이 거의 없다.
한마디로, 北韓에서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국방비를 정부예산의 30% 정도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經濟構造 때문이다. '경제에서 자립'이라는 원칙 아래 ①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② 대내적으로 중앙집권적, ③ 대외적으로 폐쇄적, ④ 중공업 우선적, ⑤ 군사와 경제의 병진이라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국제경제의 변화와 주변 전략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 경제 능력에 부담이 가는 국방비를 2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또 하나의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주민들의 노동력을 무보수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경제운영방식으로 '독립채산제'와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쟁운동은 노력경쟁운동으로서, 그 기본조건은 부과된 생산과제를 얼마만큼 초과 완수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운동은 해방이후부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건국초기에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부터이다. 이때 노동강화를 통한 생산증대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共産主義思想으로 교양, 개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써 '천리마운동'을 내세웠다. 그 이후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60년대에 '청산리마운동'을 내세웠다. 그 이후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60년대에 '청산리 방법 및 대안의 사업체계', 70대에 '3대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 80년대에 '80년대 속도창조운동'등이 있었다.
'80년대 속도 창조 운동'은 김정일의 주도하에 종래의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을 가미하여 작업성과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2차 7개년 계획',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4대자연개조사업'등의 經濟開發計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활로를 찾으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의 목적 아래 북한의 주민들은 자기본래의 직업과 직장이 있어도-예를 들어 당•정부의 관리, 군인, 기업소의 직원, 학교의 선생과 학생을-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년에 일정기간을, 때로는 수시로 노력동원에 참가해야 한다. 이 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전 주민이 그 대상이며, 점점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다.
노력경쟁운동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생산목표 또는 부여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비롯한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며 노동의 정신적 자세와 작업의 기율을 역설한다. 그리고 어느 공장이나 건설장에 동원되는 주민들을 군대식으로 조직하고 통제하여 작업반 또는 소조별로 경쟁을 지키며,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소위 선동대원들이 와서 행진곡 비슷한 경음악을 연주한다.
社會主義競爭運動은 하나의 경제운영방식이지만 주민들을 군대처럼 조직하고 노동현장을 전투현장처럼 통제하고 있으므로 북산사회는 준군대화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된 경제력으로 과도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군대도 특별한 임금의 대가 없이 많은 인원과 장비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에 북한군대는, 예를 들어, 평원고속도로, 안주탄광확장공사, 평양지하철공사, 미림 갑문 공사를 건설하였고 1980년대에도 대천발전소, 남포갑문, 금강산댐 및 발전소, 10여 개의 간석지 등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에 투입되었다.
북한은 최근 이러한 경제구조를 갖고서 경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것 같다. 1989년에 와서 외국과 합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경공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대책은 중국과 소련처럼 한국과 군비경쟁의 중지일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인 처방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며 김일성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단순히 경제구조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 체제목표, 권력구조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韓半島軍備統制의 관점에서 볼 때 당분간, 최소한 김일성이 살아 있는 한 이러한 북한경제구조는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軍事費支出은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Ⅵ. 대외정책과 활동
대외정책과 軍備統制問題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軍備統制政策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교정책과 활동에 반영된다. 특히 인접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국방태세와 군사 전략적 입장은 외교정책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軍備統制에 성공하려면 평화로운 주변환경과 주변국가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관련해서 인접국가들에게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韓半島의 문제-긴장완화, 전쟁예방, 통일-에 관한 북한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통일의 3대 원칙으로서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통일, 둘째로 주변4국의 남북한 교차승인과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반대, 셋째로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넷째로 '고려연방제' 방안에 의한 통일,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선전하고 있으며 中蘇를 위시한 社會主義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4가지의 정책 중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제일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 中國의 당 총서기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은 이러한 주장을 다시 강조하였고 조자양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 蘇聯의 경우에 89년 5월 15일∼18일 고르바쵸프라 中國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문제에 대해 두 번 거론하였으며,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 고르바쵸프는 "한반도의 평화적 민주적 재통일이 실현되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기조의 입장과 변화된 것이 없지만 소련최고지도자가 中蘇정상회담 중에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中蘇가 韓國에 대한 北韓의 정책을 지지해 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딘가 일치되지 않은 면도 있다. 조자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과 조자양은 양측의 국내정책의 성공적 결과를 서로 찬양하고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자양만 약간 언급하고, 김일성은 일체 말이 없었다. 蘇聯의 경우에 고르바쵸프가 등장한 이후 북한과의 군사 및 경제협력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시켰고 蘇聯은 계속적으로 북한의 대 한국정책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까지 방문한 고르바쵸프는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북한 共産主義體制는 태어날 때부터 蘇聯의 지원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蘇聯의 제1인자가 한반도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최근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내 및 내외관계의 변화, 동북아시아에서 새로 형성되고 있는 美•中•蘇 關係, 한국과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증진 등 이러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고르바쵸프의 북한방문이 있었다면 이 방문은 북한의 대 한국입장을 보다 강화해 주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르바쵸프의 北韓의 대 韓國政策支持는 북한의 대 韓國政策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북한은 1984년 1월 이후 공식적으로 美國과 직접적인 대화-3자 회담 또는 2자 회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랑군 테러사건(1983. 10)과 KAL 858테러사건(1987. 11)으로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1988년에는 북한의 학자들이 美國을 방문하여 韓半島문제에 관한 토의도 하였다. 또한 中國의 중재로 北京에서 4차의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쌍방이 북경 주재 정무참사관급의 접촉이었는데 北韓측이 대사급으로 높일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중국 당 총서기 조자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美國은 대화의 급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북한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양측이 접촉 시 어떤 내용을 토의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15일 네 번째 접촉이 있었던 그 다음날(5•16) 북한은 로동신문 논설을 통하여 ① 주한미군 철수 ②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과 접촉하여 몇 가지 문제를 거론했을 것이며 그 중에서 3자 회담 또는 단독회담을 틀림없이 주장했을 것으로 본다.
北韓이 美國과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식은 韓國이 사회주의국가를 특히 中國과 蘇聯에 접근하는 방식과 다르나 韓國은 경제적, 문화적 관계의 증진을 그 첫 단계로 하여 비정부 교류부터 시작하는데, 北韓은 바로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 대 정부 접촉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북한도 소위 '인민외교' 방식이 있으나 미국에게는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을 남북한대화와 교류에서 한국정부가 '당국 대 당국' 회담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비정부 차원의 접촉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대화목적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다르게 취하고 있다.
북한은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협력과 교류를 추구하면서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는 주제가 북한의 통일방안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다. 상대방국가들에게 북한의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임을 설득하고, 나아가 그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지지발언을 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 발언하는 대표적인 국가들로서는 中蘇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이외에 쿠바, 베트남, 몽고, 에티오피아, 니카라구아, 시리아, 남예멘, 앙골라, 베닌, 가봉, 모잠비크, 짐바브웨, 브룬디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軍備統制와 관련이 있었던 1988년 유엔총회의 연설에는 韓國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서열의 인물을 대리로 보냈다. 1988년 6월 10일 제3차 유엔 군축특별총회연설에서 양측의 외무부장관이 초대되었으나 북한은 외교부장 김영남 대신에 駐유엔대사 박길연이 연설하였고, 동년 10월 18일 제43차 유엔총회본회의 연설에 북한의 주석 김일성과 한국의 대통령 노태우가 초대되었으나 북한에서는 정무원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방안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전세계에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한국과 동급의 인사가 참석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韓半島問題를 토의하는 것을 싫어하고, 나아가 그 결과가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의 대외정책과 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韓半島軍備統制戰略은 어떻게 하면 駐韓美軍을 韓半島에서 철수시키느냐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남북한간의 군사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제는 토의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韓國과 軍備統制協商의 대상으로 본다. 외교적으로 인접국가들의 협력을 얻어, 직접 美國과 협상하여 해결하려 한다.
Ⅶ. 結 論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대남 대화 제안 이 다섯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의 軍備統制槪念은 최소한 軍事裝備와 兵力을 감소하자는 것은 아니며, 軍備統制政策은 계속적으로 한국보다 우월한 군사력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전략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느냐이며, 그 첫 목표가 駐韓美軍의 철수이다. 한국에 대한 군사회담제안내용과 대외정책 및 활동은 군사력의 감소를 주장하지만 그 핵심은 주한미군철수이다. 대내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는 군비의 감소와는 정반대로 군비증강을 계속하여, 하시라도 한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준비태세를 만들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북한의 한반도 軍備統制政策은 한국적화전략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북한의 軍備統制政策이 가까운 장래에 변화될 전망은 없다. 경제적 곤란이 軍備統制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군사비의 감소를 북한이 결심할 정도가 되려면 그 이전에 우리는 보다 많은 북한 대내외 정책의 변화나 사건들을 먼저 보아야만 할 것이다. 中蘇를 위시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를 김일성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고려할 것이다. 蘇聯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최근 中國政府가 당면하고 있는 학생운동을 김일성은 경제발전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북한 자신의 주민들에 대한 정치 사상적 강조, 사회적•경제적 통제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하나 북한의 軍備統制政策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국이다. 한국에서 국내정치의 민주화, 지속적인 경제성장, 韓•美關係의 재정립, 성공적인 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증진 등은 북한의 軍備統制政策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석호(국방대학원)
북한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군감축과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해온 이유와 1980년대에 한반도의 비핵화 계획을 밀어 부친 동기, 즉, 북한노동당규약(1980년 10월 6차 당대회 개정)에 발맞춰, “민족해방” 이란 명목으로, '혁명위업'- 바로 한국의 공산화하여, 한국을 북한에 편입해 통일하려는 그들의 의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방대학원의 이석호씨의 글을 블로그에서 퍼온것입니다.
http://kr.blog.yahoo.com/sockokyu/1462764
北韓의 軍備統制 政策
I. 序 論
오늘날 韓國과 北韓의 상호관계는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경쟁적, 적대적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韓國과 北韓은 서로 준수하기로 약속한 휴전협정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방 방어지역은 물론 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 진지를 구축하여 요새화하고 있다. 군사정전협정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는 문자 그대로 비무장지대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비무장지대가 무장화, 요새화 되어 유사시에 양측의 최전방 방어지역, 또는 공격출발진지로 되어가고 있다. 양측은 韓國戰爭이 끝난 후부터 오늘까지 점진적으로 國防費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로 시간이 흐를수록 쌍방의 군사력은 증강되었으며 양측 사회의 전쟁준비태세 또한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방면은 양측은 군비경쟁을 하면서도 군비경쟁이 가져온 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전쟁위험성의 증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韓國과 北韓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의 감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이 論文에서는 북한에 관해서만 토의하려고 한다.
韓國과 北韓간에 형성된 긴장과 적대적인 군사관계에 대해 북한의 정책은 무엇인가? 北韓은 이러한 군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이나? 보다 기본적인 질문으로서, 北韓은 오늘날 韓國과 北韓간의 군사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北韓은 정말로 韓國과 軍事問題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북한이 말하는 정치•군사회담은 韓半島 군비통제를 위한 것인가? 북한은 軍備統制를 대 한국 군사정책 및 韓半島統一政策(소위 한반도 적화전략)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나? 이러한 질문들을 기초로 하여 北韓이 갖고 있는 軍備統制 개념과 韓半島 軍備統制에 대한 북한의 정책을 밝히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II. 軍事會談 提案 內容
韓國과 北韓은 군사력 증강을 위주로 전쟁준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재통일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상호 제안하여 왔다. 한반도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휴전이후부터 1989년 말까지 북한은 64회, 한국은 29회 軍備統制方案을 상대방에게 제안했다.
도표1: 한국•북한의 군비통제제안 횟수
韓國은 北韓에 비하여 제안 빈도수는 적지만 시기적으로도 1970년 8월 15일에 처음으로 광복절 25주년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제안했다. 그 이후 모든 제안의 내용도 매우 단순하고 제한적이며, 점진적이다. 1970년부터 1989년 말까지 29회를 제안했으나 모든 제안을 '무력 포기에 관한 선언 또는 협정체결' '상호신뢰구축방안'으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軍備統制 실천문제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상호신뢰구축 분위기 조성을 제일 중요한 첫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1988년 6월 10일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제3차 유엔군축특별총회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군축3단계 접근방안'이나, 같은 해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본회의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平和市 건설'제의는 한반도 軍備統制問題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北韓은 韓國보다 2배 이상을 제안했으며 매 회마다 2가지 이상의 안건을 제시하였고 한반도 군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안건을 거론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이 제안한 안건들은 9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북한이 가장 빈번하게 제안한 안건은 ① 주한미군 철수, ② 상호병력과 장비 감축, ③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장 빈번하게 주장했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주한미군이란 北韓이 韓國을 가장 뚜렷하게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며, 자신의 대 한국 군사우위를 실질적으로 상쇄하는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환경조성의 방해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체결 또한 매우 빈번히 제안되었는데, 북한은 오늘 그 체결대상을 韓國이 아니라, 美國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1974년 3월 이전까지는 평화협정을 한국과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美國과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북한의 대 한국전략의 첫째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임을 말하며, 나아가 한•미간을 이간시키려 하는 것이다.
韓國은 병력과 장비의 감축을 軍備統制의 안건으로 제안한 적도 없으며 더욱이 軍備統制 첫 단계로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병력과 장비의 감축을 빈번하게 제안하고 있으며 그것도 신속하게 축소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상이한 입장은 양측이 군사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의도의 차이에서 온다고 보여진다. 지난 40년간의 북한군사력의 증강추세와 오늘날 군사적 준비태세를 볼 때 북한의 군비축소 주장은 많은 의문점을 남겨 놓는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서는 자신의 군사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또는 한국사회를 분열, 혼란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볼 때 비현실적인 제안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3가지 안건 이외에 최근 北韓의 강경한 주장은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이다. 北韓은 1980년대에 와서 국제적으로 반핵 운동의 확산, 고르바쵸프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핵 지대화 주장에 편승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주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 운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술핵 무기의 철수를 의미하나,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제안하여 온 내용들을 근거로 할 때 북한의 의도는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 군사력의 감축이다. 1987년 7월과 1988년 11월에 한국에게 제시한 軍備統制案은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단계별 감군을 제안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제안하여 온 모든 내용과 오늘날 북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단계적'이라는 측면도 한국과 기본적으로 다르며, 지금까지 한국이 주장해 온 '신뢰구축 방안'과 '무력사용 포기' 문제와 타협하려는 의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은 주한미군과 전술핵무기 철수, 한국과 북한병력 및 장비의 감축, 이를 위하여 3자 회담을 개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체결, 한국과 불가침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한국이 우선시하는 '상호신뢰구축'과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으로 '軍備減縮'부터 실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표현하면, 한국은 군비의 감축을 제의한 적이 없고, 북한은 상호신뢰 구축을 가장 적게 언급하였다. 韓國과 北韓이 제안한 내용만을 근거로 할 때 북한이 한국보다 더 긴장완화에 열성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의 진실여부는 다른 측면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Ⅲ. 軍事準備態勢
북한은 全韓半島의 공산화를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 한국을 상대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군사력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혁명분위기가 조성되어 결정적인 시기라고 판단되면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 분위기를 혁명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의도 하에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대 한국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군사 이론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蘇聯군사이론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군사이론을 발전시켰다. 새로이 발전시키고 있는 군사이론에는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경험, 한국전쟁 경험, 한국적인 지형과 기후, 모택동의 인민전쟁론, 타국의 전쟁 경험(베트남과 중동전쟁), 美國과의 전쟁 예상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1962년 12월 소위 '국방에서 자위'노선을 선언하는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였다.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정책으로써 북한은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다. 1966년에는 국방•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여 북한은 군수산업능력을 일찍이 발전시키기 시작하여 오늘날 군사력증강의 기틀을 세웠다.
북한은 새로운 군사이론의 모색과 독자적인 軍事政策을 발전시켜 60년대 말까지를 군사전략의 기본개념으로서 '총력, 기습, 배합, 속전속결'을 확립하고, 이 개념을 전쟁터에서 작전화 시키기 위하여 작전전략, 무기체계, 군사교리 및 훈련을 발전시키고 있다. 1950년대에는 북한의 병력과 장비가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열세하였으나 60년대 말부터 추월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훨씬 우세한 입장에 있다.
軍事裝備를 양적으로 확대하면서 질적으로도 개선하고 있다. 지상군의 경우, 장비의 경량화, 자동화, 장갑화 시키면서, 부대구조도 소규모화, 기갑•기계화•포병 및 특수부대를 증가시켜, 기동과 화력을 강조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공격과 침투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찍이 잠수함을 보유하기 시작했으며, 거의 모든 함정이 소형이며, 공격전용의 쾌속정과 고속 상륙정을 발전시키면서 대량 보유하고 있다. 空軍의 경우에도 기습과 침투를 위하여 AN-2와 헬기를 다량보유하고 있으며, 작전반경 확대를 위하여 1985년 이후 MIG-23/29를 도입했다.
1980년대에 북한은 기습전과 단기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부대훈련은 공격위주로 실시하면서, 특히 급속도화를 강조하고, 전 한국 지역을 단기간에 점령하는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보병위주의 부대구조에서 기갑, 기계화, 포병부대를 증가시켰고 지상군, 해군•공군을 전반적으로 약50% 평양-원산이남지역으로 추진, 재배치시켰으며 휴전선부근에 대량의 병력과 장비를 은폐•엄폐시킬 수 있는 지하갱도를 구축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거의 10년 늦게 독자적인 전쟁준비태세를 준비하기 시작하여 아직도 북한에 비하여 군사력을 위시한 전쟁준비태세에 있어서 열세한 입장이다. '한국은 오늘날 대 북한 군사전략의 기본개념을 억제와 방어로 확립하는 모든 군사훈련상황과 무기체계의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전략차원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위하여 공세적 성격의 병력과 장비의 운용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군수산업능력은 북한에 비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세한 상황이며, 자체의 군사력 증강수요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GNP 규모의 확대로 국방비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북한보다 더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보다 우수한 장비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군사력증강 속도를 유지하면 2000년대 초에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寒微聯合防禦體制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 및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현시점에서 남북한간의 군사준비태세는 불균형적이고 불안정하며,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태이다. 오직 주한미군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軍備統制에서 자신의 우월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駐韓美軍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략적인 군사적 안정을 파괴하려 획책하고 있다.
Ⅳ. 政治體制의 目標
어느 정치 체제이든 간에 체제의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와 수단 및 방법의 선택은 정치지도자들의 세계관, 가치관, 경험 및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체제가 1인 또는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정치문화가 전체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일수록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발전 또는 정치체제의 목표와 수단의 선택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경우에 정치체제의 목표와 발전수단의 선택이 주민들에게 거의 없고, 김일성에게 있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는 체제의 목표와 목표달성수단이 한반도 군비통제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오늘날 북한의 국내외정책과 활동을 보면 북한공산체제, 또는 김일성 체제의 目標는 다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에서 '혁명위업'의 완수이다. 즉 한국을 공산화한다는 것으로, 북한공산주의체제가 태어날 때부터 추구하고 있다. 둘째로는 경제발전, 셋째로는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완수이다. 첫째 목표는 북한체제의 지상최고의 목표이며 나머지 두 개 목표를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목표인 경제발전은 어느 국가나 갖고 있으며 인류의 영구적인 과제이다. 북한의 경우에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해 주민들의 복지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심지어 경제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셋째 목표는 현재 진행중인 김부자 세습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자는 것이며, 오늘날 북한이 당면한 제일 중요한 과제이며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세습체제방식으로 권력을 이양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체제의 목표로서 ㉮ 남조선해방과 ㉯ 부자세습체제를 다루고 경제발전 문제를 제5장에서 따로 논의하겠다.
가. 南朝鮮 解放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위업'은 바로 한국의 공산화, 즉 '남조선해방'을 의미한다. 북한노동당규약(1980년 10월 6차 당대회 개정)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의 當面目的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북한체제의 목표를 정의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일성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연말경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 일년 중 거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의 연설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어느 나라이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의 보전, 평화유지 등의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강조한다. 북한지도자들이 주민들에게 강조하는 '혁명위업'은 안보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한국의 존재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논리다. 문자 그대로 북한에서는 '南朝鮮 解放'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하게, 또 아무리 빈번하게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勞動新聞은 매일 어떤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든 최소한 하나 정도는 남조선혁명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해방'의 필연성과 주민들의 사명감을 강조한다. 남조선해방의 필연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를 두고, 주민들의 사명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이용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한반도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려면 한국이 미 제국의자들과 그 앞잡이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만 갖고서는 평화시에 주민들의 경각심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한국과 미국에 의한 북침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지원을 받는 남쪽의 '파쇼도당들'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절박'하다고 주민들에게 말한다. 북한의 한국위협 주장은 해마다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을 83년을 전후로 비교할 때, 한국에 대한 비난의 강조가 커지고, 규탄대회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준 전시상태 선포, 최고사령관 명령하달, 한국과 대화의 중단 등이 있었다. 한국의 북침 위협을 대전제로 하고 동시에 '南朝鮮 解放'을 약속하면서 전쟁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나. 父子세습체제
북한의 대내외 활동을 보면 김정일의 권력계승작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체제의 목표임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후계자작업을 1970년대 초부터 시작했으며,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사실상의 후계자로 공포했다. 1986년 6월 1일 김일성은 '김일성 고급 당학교' 창립 40돌을 맞이하여 '朝鮮勞動黨 건설의 歷史的 경험'을 발표하면서 '혁명위업 승계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그는 권력을 인계받지 못하고 있으며 김일성은 그의 아들 김정일의 지도력을 키워주고 부각시키기 위하여 아직도 고심하고 있다. 북한은 부자세습체제의 정통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습체제를 지지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구축하면서 이론적으로 몇 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北韓勞動黨의 수령론에 근거를 두고, 김일성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지시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둘째로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놓은 '혁명위업'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셋째로 후계자는 김일성의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서 나와야 한다.
넷째로 김일성이 세워놓은 주체혈통을 이어받을 자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후계자의 기본적인 자질은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후계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이유는 김일성이 자신이 정해놓은 혁명과업의 불멸성을 영구히 보장하려는 데 있다.
김정일의 權力承繼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나 권력구조의 구축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세습논리와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하는 많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왜 김정일?'은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북한은 김정일의 영도력을 선전하면서, 동시에 김일성과 동급수준으로 김정일의 우상화작업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바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혁명사적지'를 10개 조성하였고 최근에는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김정일 문헌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8년 2월에는 金正日花를 지정, 동년 11월에는 正日峰을 개막하였다. 북한은 젊은 세대들의 사상무장을 강조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代를 이은 忠誠'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일의 47회 생일을 전후로 해서 북한의 매스미디아들은 김정일에 대한 헌신적 충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당은 곧 수령이며 수령은 곧 당이다."라고 대전제를 하고 당 중앙으로 지칭되어 온 김정일을 '수령'으로까지 묘사하였다.
북한은 체제의 목표로써 '南朝鮮 解放'과 '부자세습체제'를 택하고 그 수단으로서 '위협의식조성' '우상화와 충성심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최소한 한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국내정치여건이 아니다. 南朝鮮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북침 위협의 위기감고조는 군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부자세습체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어도 김정일의 한계는 정치적으로 독재체제 또는 소수지배체제를, 대외적으로는 폐쇄적 체제 또는 엄격히 통제되는 개방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軍備統制를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세습체제---부자세습이든 아니든---의 기본 목적의 南朝鮮革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과 북한간의 軍備統制또는 감축은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經濟構造와 國防費
어느 정치체제나 經濟的 번영을 추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북한은 한국보다 일찍이 계획경제에 눈을 떠서, 1947년부터 시작한 이래, 오늘날에는 3차 7개념계획(1987-1993)을 실시 중이다. 그 동안 북한은 성공의 환희를 맛본 적도 있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좌절의 상태가 시작되었다. 오늘날, 북한이 얼마만큼이나 經濟問題를 강조하느냐는 경제에 관한 노동신문의 사설의 빈도 수에 잘 나타나 있다.
도표 3 : 1988년도 노동신문사설의 분야별 분석
또 하나 북한이 經濟問題를 고민하는 지표로서 북한은 1984년 이후 정무원의 경제 부서를 14차례 개편했으며 총리는 3번(이종옥→강성산→이근모→연형묵) 교체했으며, 특히 86년 이후 國家計劃委員長을 5차례 교체했는데 그중 홍성남을 세 번이나 기용했다. 북한은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정했으며, 정무원 경제 부서에 전자•자동화 공업위원회와 합영 공업부를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는 북한이 외채상황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보았고, 북한을 방문한 외국기자들, 중국과 일본에 이는 한국교포들을 통하여 북한의 주민생활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특히 식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상황과 관련하여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어떻게 軍事費를 계속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었나? 북한이 경제적 낙관에 부딪쳐 있으며 새로운 정책변화가 없으면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1980년부터 있었는데 북한은 왜 그 동안에 시정 못했을까? 북한은 오늘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북한은 89년도 군사비를 정부예산의 12.1%로 책정하고, 88년에는 12.2%를 사용했다고 지난번 최고인민회의 8기 5차 회의(89. 4. 7∼8)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은 정부예산에 약 30%를 國防費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北韓이 실제로 국방비를 얼마 지출하는가를 정확히 모르지만 북한이 실질 국방비를 은폐하고 있으며, 발표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北韓의 國防費는 1971년에 31.1%이었는데, 그 이후 매년 감소하여 1989년에는 12.1%를 책정했다고 한다. 북한의 국방비는 1972년부터 계속 감소하였는데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이다.
둘째로 북한은 1987년 12월에 병력 10만 명을 일방적으로 감군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88년 국방비의 1% 감소는 이러한 감축을 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
셋째로 북한은 1972년부터 국방비를 인민 경제비와 사회문화비에 은폐시키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국방비가 1966년에 10.0%, 1968-1971년에 30%이었다가, 1972년에는 17.0%, 1989년은 12.1%이다. 이렇게 국방비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 인민 경제비와 사회문화비의 변화를 보면 1972년부터 국방비의 일부가 은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로 북한의 주장대로 1972년부터 1989년까지 국방비의 감소 폭이 14.1%에서 18.9%까지 증가하였고 인민 경제비의 증가폭은 11.3%에서 23%까지 증가하였다면 실질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민 경제비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국방비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정도는 1967-71년 사이에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예산의 3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北韓은 1967년부터 軍事費를 급격히 증가시킨 결과 人民經濟費支出에 크게 차질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둔화, 나아가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어려움을 초래했으므로, 주민들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하여 1972년부터 실제 軍事費支出規模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배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침체원인이 바로 국방비를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경제의 침체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유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체제의 본질적인 성격이 공유재산제, 경제가 계획적, 통제적, 폐쇄적이므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체제에게 동기와 경쟁심을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3가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때문이다. 自力更生政策은 대외적으로 국제적 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대내적으로 기술의 낙후를 초래하였고, 重工業優先政策은 자원의 낭비와 산업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軍事•經濟竝進政策은 군수산업에 과도하게 투자하도록 강요했다. 셋째로는 국민경제능력과 정부재정에 비하여 國防費가 장기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앞장에서 토의되었던 체제 목표와 수단이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북한경제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침체되어도 정치지도자가 혁명위업과 세습체제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재정의 많은 양을 여기에 할당한다면 국민경제는 자동적으로 위축될 뿐이지 적절히 대응할 구조적 기능이 없다. 또 북한경제구조는 정부가 결정하는 所得分配構造 자체가 하나의 당위이지 누가 이 問題를 시비 걸 수도 없으며,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자원의 재할당에 있어서도 성장주도적 부문에 대한 자원할당이 강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에 대한 아무런 인지방법(Monitoring System)이나 이에 대응하는 보완방법(Proactive Measures)이 거의 없다.
한마디로, 北韓에서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국방비를 정부예산의 30% 정도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經濟構造 때문이다. '경제에서 자립'이라는 원칙 아래 ①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고 ② 대내적으로 중앙집권적, ③ 대외적으로 폐쇄적, ④ 중공업 우선적, ⑤ 군사와 경제의 병진이라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국제경제의 변화와 주변 전략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 경제 능력에 부담이 가는 국방비를 2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또 하나의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주민들의 노동력을 무보수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경제운영방식으로 '독립채산제'와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쟁운동은 노력경쟁운동으로서, 그 기본조건은 부과된 생산과제를 얼마만큼 초과 완수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운동은 해방이후부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건국초기에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부터이다. 이때 노동강화를 통한 생산증대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共産主義思想으로 교양, 개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써 '천리마운동'을 내세웠다. 그 이후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60년대에 '청산리마운동'을 내세웠다. 그 이후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60년대에 '청산리 방법 및 대안의 사업체계', 70대에 '3대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 80년대에 '80년대 속도창조운동'등이 있었다.
'80년대 속도 창조 운동'은 김정일의 주도하에 종래의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을 가미하여 작업성과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2차 7개년 계획',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4대자연개조사업'등의 經濟開發計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활로를 찾으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의 목적 아래 북한의 주민들은 자기본래의 직업과 직장이 있어도-예를 들어 당•정부의 관리, 군인, 기업소의 직원, 학교의 선생과 학생을-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년에 일정기간을, 때로는 수시로 노력동원에 참가해야 한다. 이 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전 주민이 그 대상이며, 점점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다.
노력경쟁운동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생산목표 또는 부여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비롯한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며 노동의 정신적 자세와 작업의 기율을 역설한다. 그리고 어느 공장이나 건설장에 동원되는 주민들을 군대식으로 조직하고 통제하여 작업반 또는 소조별로 경쟁을 지키며,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소위 선동대원들이 와서 행진곡 비슷한 경음악을 연주한다.
社會主義競爭運動은 하나의 경제운영방식이지만 주민들을 군대처럼 조직하고 노동현장을 전투현장처럼 통제하고 있으므로 북산사회는 준군대화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된 경제력으로 과도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군대도 특별한 임금의 대가 없이 많은 인원과 장비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1970년대에 북한군대는, 예를 들어, 평원고속도로, 안주탄광확장공사, 평양지하철공사, 미림 갑문 공사를 건설하였고 1980년대에도 대천발전소, 남포갑문, 금강산댐 및 발전소, 10여 개의 간석지 등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에 투입되었다.
북한은 최근 이러한 경제구조를 갖고서 경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것 같다. 1989년에 와서 외국과 합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경공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대책은 중국과 소련처럼 한국과 군비경쟁의 중지일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인 처방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며 김일성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단순히 경제구조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 체제목표, 권력구조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韓半島軍備統制의 관점에서 볼 때 당분간, 최소한 김일성이 살아 있는 한 이러한 북한경제구조는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軍事費支出은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Ⅵ. 대외정책과 활동
대외정책과 軍備統制問題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軍備統制政策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교정책과 활동에 반영된다. 특히 인접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국방태세와 군사 전략적 입장은 외교정책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軍備統制에 성공하려면 평화로운 주변환경과 주변국가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관련해서 인접국가들에게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韓半島의 문제-긴장완화, 전쟁예방, 통일-에 관한 북한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통일의 3대 원칙으로서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통일, 둘째로 주변4국의 남북한 교차승인과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반대, 셋째로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넷째로 '고려연방제' 방안에 의한 통일,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선전하고 있으며 中蘇를 위시한 社會主義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4가지의 정책 중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제일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 中國의 당 총서기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은 이러한 주장을 다시 강조하였고 조자양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 蘇聯의 경우에 89년 5월 15일∼18일 고르바쵸프라 中國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문제에 대해 두 번 거론하였으며,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 고르바쵸프는 "한반도의 평화적 민주적 재통일이 실현되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기조의 입장과 변화된 것이 없지만 소련최고지도자가 中蘇정상회담 중에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中蘇가 韓國에 대한 北韓의 정책을 지지해 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딘가 일치되지 않은 면도 있다. 조자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과 조자양은 양측의 국내정책의 성공적 결과를 서로 찬양하고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자양만 약간 언급하고, 김일성은 일체 말이 없었다. 蘇聯의 경우에 고르바쵸프가 등장한 이후 북한과의 군사 및 경제협력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시켰고 蘇聯은 계속적으로 북한의 대 한국정책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까지 방문한 고르바쵸프는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북한 共産主義體制는 태어날 때부터 蘇聯의 지원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蘇聯의 제1인자가 한반도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최근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내 및 내외관계의 변화, 동북아시아에서 새로 형성되고 있는 美•中•蘇 關係, 한국과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증진 등 이러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고르바쵸프의 북한방문이 있었다면 이 방문은 북한의 대 한국입장을 보다 강화해 주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르바쵸프의 北韓의 대 韓國政策支持는 북한의 대 韓國政策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북한은 1984년 1월 이후 공식적으로 美國과 직접적인 대화-3자 회담 또는 2자 회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랑군 테러사건(1983. 10)과 KAL 858테러사건(1987. 11)으로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1988년에는 북한의 학자들이 美國을 방문하여 韓半島문제에 관한 토의도 하였다. 또한 中國의 중재로 北京에서 4차의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쌍방이 북경 주재 정무참사관급의 접촉이었는데 北韓측이 대사급으로 높일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중국 당 총서기 조자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美國은 대화의 급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북한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양측이 접촉 시 어떤 내용을 토의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15일 네 번째 접촉이 있었던 그 다음날(5•16) 북한은 로동신문 논설을 통하여 ① 주한미군 철수 ②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과 접촉하여 몇 가지 문제를 거론했을 것이며 그 중에서 3자 회담 또는 단독회담을 틀림없이 주장했을 것으로 본다.
北韓이 美國과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식은 韓國이 사회주의국가를 특히 中國과 蘇聯에 접근하는 방식과 다르나 韓國은 경제적, 문화적 관계의 증진을 그 첫 단계로 하여 비정부 교류부터 시작하는데, 北韓은 바로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 대 정부 접촉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북한도 소위 '인민외교' 방식이 있으나 미국에게는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을 남북한대화와 교류에서 한국정부가 '당국 대 당국' 회담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비정부 차원의 접촉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대화목적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다르게 취하고 있다.
북한은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협력과 교류를 추구하면서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는 주제가 북한의 통일방안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다. 상대방국가들에게 북한의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임을 설득하고, 나아가 그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지지발언을 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 발언하는 대표적인 국가들로서는 中蘇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이외에 쿠바, 베트남, 몽고, 에티오피아, 니카라구아, 시리아, 남예멘, 앙골라, 베닌, 가봉, 모잠비크, 짐바브웨, 브룬디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軍備統制와 관련이 있었던 1988년 유엔총회의 연설에는 韓國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서열의 인물을 대리로 보냈다. 1988년 6월 10일 제3차 유엔 군축특별총회연설에서 양측의 외무부장관이 초대되었으나 북한은 외교부장 김영남 대신에 駐유엔대사 박길연이 연설하였고, 동년 10월 18일 제43차 유엔총회본회의 연설에 북한의 주석 김일성과 한국의 대통령 노태우가 초대되었으나 북한에서는 정무원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방안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전세계에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한국과 동급의 인사가 참석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韓半島問題를 토의하는 것을 싫어하고, 나아가 그 결과가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의 대외정책과 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韓半島軍備統制戰略은 어떻게 하면 駐韓美軍을 韓半島에서 철수시키느냐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남북한간의 군사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제는 토의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韓國과 軍備統制協商의 대상으로 본다. 외교적으로 인접국가들의 협력을 얻어, 직접 美國과 협상하여 해결하려 한다.
Ⅶ. 結 論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대남 대화 제안 이 다섯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의 軍備統制槪念은 최소한 軍事裝備와 兵力을 감소하자는 것은 아니며, 軍備統制政策은 계속적으로 한국보다 우월한 군사력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전략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느냐이며, 그 첫 목표가 駐韓美軍의 철수이다. 한국에 대한 군사회담제안내용과 대외정책 및 활동은 군사력의 감소를 주장하지만 그 핵심은 주한미군철수이다. 대내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는 군비의 감소와는 정반대로 군비증강을 계속하여, 하시라도 한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준비태세를 만들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북한의 한반도 軍備統制政策은 한국적화전략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북한의 軍備統制政策이 가까운 장래에 변화될 전망은 없다. 경제적 곤란이 軍備統制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군사비의 감소를 북한이 결심할 정도가 되려면 그 이전에 우리는 보다 많은 북한 대내외 정책의 변화나 사건들을 먼저 보아야만 할 것이다. 中蘇를 위시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를 김일성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고려할 것이다. 蘇聯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최근 中國政府가 당면하고 있는 학생운동을 김일성은 경제발전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북한 자신의 주민들에 대한 정치 사상적 강조, 사회적•경제적 통제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하나 북한의 軍備統制政策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국이다. 한국에서 국내정치의 민주화, 지속적인 경제성장, 韓•美關係의 재정립, 성공적인 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증진 등은 북한의 軍備統制政策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석호(국방대학원)
추천0 비추천0
Loading...
댓글목록
유포조종사님의 댓글
 천사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천사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한문은 어려워.........수고하셨습니다.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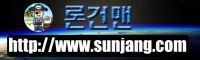
 사라랜스
사라랜스 nabool
nabool